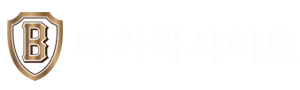영어학과
김강 교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지 70주년을 맞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연이 아직 자욱했던 1952년에 즉위했으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권좌에 머문 군주가 탄생한 것이다.
주빌리(Jubilee)는 유대 역사가 그 뿌리다. 안식의 해를 뜻하는 '유발' 혹은 '유빌리'가 기원이다. 유대민족이 낙원으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부터 계수하여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일컫는다. 지금은 영연방 문화권에서 결혼기념일이나 국왕의 재위 기간을 기릴 때 쓰인다. 횟수에 따라 명칭을 달리해 실버는 25주년, 골든 주빌리는 50년에 해당한다.
그전에 최장수 재위 타이틀은 하노버 왕조의 마지막 군주 빅토리아 여왕이었다. 추측건대 그녀가 여자였기에 알렉산더나 세종처럼 '대왕'이라는 숭배의 존칭이 따라붙진 않은 듯하지만 19세기 후반 절정에 오른 대영제국의 기틀을 다진 여장부였다. 런던 버킹엄 궁전 앞 휘황찬란한 금색으로 휘감은 여왕의 동상은 그녀의 위업을 가늠케 한다.
빅토리아는 아편에 취한 청나라를 난징조약으로 굴복시킨 후 거대한 반도의 창구인 홍콩을 획득하고 향후 100년간 조차했다. 극치에 오른 기분을 말할 때 비유적으로 내뱉는 '홍콩 간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유래됐을 성싶다. 영국이 수십 배 덩치의 인도를 정복할 당시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는 그녀에게 '인도 여제'라는 영예를 헌정했다. 게다가 보어전쟁에서 남아프리카를 영토에 편입했다. 영국은 그녀를 근대적 군주의 본보기로 삼았다.
1897년 6월 20일 빅토리아 여왕 재위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 주빌리가 열렸다. 우리로 치자면 환갑잔치와 다름없다. 2022년 엘리자베스 2세의 70주년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백금, '플래티넘' 주빌리라 부른다. 런던 언더그라운드 지하철에 왕실의 퍼플색을 칠한 '엘리자베스 라인'도 신설됐다. 한동안 보기 어려울 사람과 권력의 장수 만세 퍼레이드다.
영국사에서 여왕의 첫 무대는 튜더 가문이 열었다. 흰 장미 문장 요크와 붉은 장미 랭커스터 가문 사이에 왕권투쟁인 장미전쟁을 봉합한 헨리 튜더는 본인의 성을 딴 왕조를 세우고 헨리 7세로 즉위한다.
그의 큰손녀인 메리 1세는 이혼을 사유로 영국의 종교를 바꾸고 로마 가톨릭 교황에 필적하는 영국국교회 수장에 오른 헨리 8세의 첫째 딸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스페인 공주 캐서린이며, 첫 남편은 결혼 직후 의문스레 죽은 헨리 8세의 형이었다. 어찌 보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처럼 삼촌이 아빠가 된 셈이다.
메리는 어릴 적 헨리 8세의 친모 냉대와 이혼, 종교적 변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즉위 후 영국을 다시 가톨릭으로 복귀시키려 했고, 이를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를 모질게 박해했다. 후일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붙은 연유다. 칵테일 이름으로도 유명하다.
메리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의 처지는 더욱 험난했다. 영화 '천일의 앤'의 모티브가 된 어머니 앤 불린은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다. 영화 제목처럼 결혼 후 3년 만에 간통과 반역죄로 참수당한다. 졸지에 반역자의 딸이 된 엘리자베스는 목숨 건 정쟁을 헤쳐내고 1558년 마침내 국왕의 반지를 손에 끼운다.
문제는 연이은 여왕에 대한 불신의 태도였다. 여자는 기질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었다. 남자는 이성적 존재이지만, 여자는 충동과 열정에 지배되기 쉽다고 여겼다.
이러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 왕실 법률가들은 '왕의 두 육체'라는 신비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다. 여왕이 즉위한 순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여왕의 '타고난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정치적 육체'와 결혼한 것이므로 나라의 안정과 영광에 전혀 해가 없다고 선전했다.
영민한 그녀는 백성의 충성심을 북돋아 나라를 통합하고 국력을 키운다. 1588년 스페인 아르마다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식민지 건설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녀의 통치기에 영국은 비로소 유럽의 변방에서 열강으로 발돋움한다. 정치와 경제, 과학과 예술을 주도했다. 셰익스피어도 이때의 산물이다.
여성의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고 번영의 '골든 에이지'를 이룩한 '처녀 여왕'은 45년간 통치 후 1603년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에게 왕관을 물린 후 영면한다. 튜더에서 윈저왕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6명의 여왕이 재위했다.
우리 정부도 '유리 천장'을 깨려는 듯 5명의 여성 장관을 천거했다. 이력들이 무쌍하다. 언론이 밝힌 일부는 고고한 학자나 공직의 달인보다는 정파적 철새에 가깝다. 때맞춰 권력의 절대 반지를 탐하는 중일까.
칼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는 반복한다. 나라를 살린 여성들의 예지와 헌신을 배워야 할 때다. 사욕에 찌든 정치적 육체는 금세 부패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