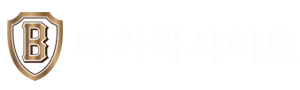미래자동차공학부
이정환 교수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었다. 이 기본소득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산이나 근로, 취업 등등의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권 차원이어서 기초생활 수급이나 실업수당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도 구분된다. 따라서 이 '기본소득'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평생, 충분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또 '가구'가 아닌 '개인'이 대상이며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도는 18세기 미국의 작가인 토머스 페인이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지대 수입을 모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자'고 주장한 데서 출발한다. 현대에 이르러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일부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정책으로 시행했고, 인도와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이 제도가 빈곤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권 주자들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되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부터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인 청년 배당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14일부터 4월 말까지 도내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재명표' 농촌·농민 기본소득 전국화는 이 후보의 대선 패배로 올 6월 지방선거 이후의 상황은 전망하기 어렵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하고, 비록 기본소득제도에 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도 이 기본소득제도의 시행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광주는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우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무엇이 광주형일자리고, 그것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어떤 도움이 되었으며, 살기 좋은 광주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궁금하다. 광주형일자리 창출이란 야심찬 공약이 말 그대로 헛공약에 그쳤지 않은가 싶다.
한 마디로 광주형일자리의 상징이자, 첫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는 첫 출발부터 전문가가 아닌 기업 경험이 전무 한 퇴임 정치인과 공무원이 경영을 맡아 세금으로 손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소형차일 뿐, 미래형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와도 거리가 멀어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이미 생산 포화가 된 상태다. 반값 연봉을 내세워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했음에도 캐스퍼는 타 브랜드의 경차와 값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경쟁력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앞으로 10만대까지 생산한다지만, 만약 사업에 손실이 나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캐스퍼를 구매하는 광주시민에게 4%의 취득세를 지원해주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기본사양이 1천370만 원, 풀옵션이 2천130만 원인 캐스퍼의 취득세를 50만 원 감면해주고, 남은 차액도 5만4천원~35만2천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차량을 사지 않은 대다수시민은 차량이 많이 팔릴수록 상대적 불이익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러잖아도 이용섭 시장은 현 정부의 초대 일자리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워 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되고 지난 4년간 광주의 살림을 맡았었다.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이었는지, 살기 좋은 광주 건설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