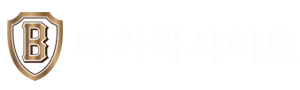사회복지학과
임다빈 학생
‘술린이, 주린이, 헬린이, 요린이, 등린이….’ SNS와 각종 미디어 콘텐츠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보았을 유행어다. ‘○린이’는 어떤 분야에서 일이 서투른 초보자에게 ‘어린이’의 뒷말을 따서 붙이는 표현으로 술린이는 ‘술+어린이’, 주린이는 ‘주식+어린이’를 뜻한다. 이렇게 ‘재치 있는’ 표현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표현이 단지 재미있으므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걸까? 답은 ‘아니오’다. ‘○린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단어 표현의 당사자인 어린이에게 부정적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인터넷 매체는 유행이 퍼져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므로 단시간에 정보를 일반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일반화로 인해 표현의 어원인 어린이에게 미숙하고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사용하거나 보는 사람들과 달리 어린이에게는 폭력적인 표현이 된다.
둘째, ‘○린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른의 지배적인 권력을 보여준다. 누군가를 ‘○린이’라고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린이’라 지칭하는 사람 또한 어린이를 ‘항상 배워야만 하는 사람’ ‘가르쳐야만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게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말이다.
작년에 우리 학과에 개설된 아동복지론 수업에서 아동 권리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우리 조는 ‘○린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78명이 참가했고, 참가자의 연령대는 10대와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 권리 침해 단어의 실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린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무응답 14명을 제외한 64명 가운데 ‘매우 자주’ ‘자주’ ‘보통’을 선택한 A집단은 총 17명(26.6%), ‘매우 가끔’ ‘가끔’을 선택한 B집단은 47명(73.4)%이었다.
이후 ‘○린이’를 아동 권리 침해 단어로 정의한 상태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인식 상태를 묻는 ‘이와 같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앞선 질문에서 나눠진 A집단과 B집단의 답변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린이’라는 단어를 매우 가끔 혹은 가끔 사용한다는 B집단의 경우 이 단어가 가진 권리 침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매우 자주’ ‘자주’ ‘보통’을 선택한 A집단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린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어린이 단어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예상 외의 설문조사 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왜 A집단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본인이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부정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많은 사람이 웃자고 사용하니 잘못된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마음가짐 혹은 동기로 사용하든 익숙하다는 이유로 ‘차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자신이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은연중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린이’를 재미로 사용한다. 사용하는 본인은 실제로 어린이가 아니고, 그 단어로 인해 어린이가 가지게 되는 이미지는 자신과 상관이 없으므로 단어가 오염되는 현상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너무 익숙해져 인식 변화를 위해 기력을 소모하는 일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 진정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사회의 모든 것은 인간이 축적한 의미를 통해 만들어진다. 만약 지금 ‘○린이’ 단어 표현을 바로잡지 않고, 재미있다는 이유로 넘겨버린다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어린이는 그저 ‘부족한 사람’으로 각인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린이’는 아동 혐오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어린이가 가진 ‘불완전함’ ‘미숙함’이라는 극히 단편적인 해석을 재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매번 ‘이게 진정 옳은 일인가?’ 하고 돌아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