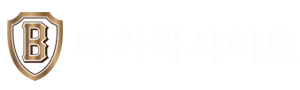신문방송학과
조경완 교수
1889년 2월 11일 일본 미에현의 이세신궁(伊勢神宮) 앞에서 암살사건이 벌어진다. 이날 이곳에서는 메이지 천황이 내각과 국민에게 내리는 흠정헌법인 메이지 헌법의 반포식이 열렸다. 그런데 여기 참석한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가 신궁 실내에서 구두를 벗지 않고 지팡이까지 짚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신궁을 나오자 마자 극우 청년의 칼에 즉사한다. 초대 내각인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각료들 중에서도 유럽 유학파 엘리트로 꼽히던 그는 서구식 교육을 거침없이 시행하며 천황주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던 터였다.
메이지 천황 치하에 근대화에 급가속 중이던 일본은 모리 암살사건을 계기로 물질문명은 서구를 추구하되, 정신문명은 완고한 국가주의, 천황주의로 완전히 회귀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0년 반포된 것이 교육칙어(敎育勅語)다.
그 빌어먹을 긴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황실의 조상이 이 나라를 연 것은 관대하고 영원한 것이며 대대로 쌓아온 덕은 깊고 두터운 것이다. 나의 신민(臣民)은 충성과 효성을 다듬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세대를 넘어 이 미덕을 실천해 왔다…” 끔찍한 대목은 중간에 나온다. “대의에 따라 용기를 갖고 몸을 바쳐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라”
이때부터 일본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월요일 아침 어진영(御眞影)배례, 천황폐하 만세봉축, 칙어봉독의 순으로 의례를 했다. 읽는데 6~7분이 걸리는 교육칙어를 학생들이 암송해야 했음은 물론이다. 1894년 청일전쟁의 승리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도 세계인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이기자 교육칙어는 이른바 ‘일본혼’의 뿌리로 숭앙되었다. 카미카제 자살공격과 전원옥쇄도 여기서 비롯된다. 교육칙어는 1948년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평화헌법이 제정될 때서야 공식 폐기됐다.
1902년 평양태생으로 박종홍이란 인물이 있다. 일제때 동경제국대 철학과에 유학하고 해방후 서울대 교수를 했다. 1968년 박정희 정부는 국민총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민교육헌장 반포를 준비한다. 문교부장관 권오병이 지휘하여 당대 지식인그룹이 총 동원된 이 작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박종홍이다. 그가 메이지천황의 교육칙어를 모방했다고 단언하긴 어려운 일이로되, 만주육사 출신의 박통이나 동경제대 출신의 박종홍이나 제국일본의 교육칙어가 발휘한 국가주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나같은 세대는 모두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해야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니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닫느니’하면서 우리들은 산업화와 반공과 예비군훈련에 청춘을 바쳤다. 엊그제 작고한 송기숙 교수님같은 지식인들이 그 우악스런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식 세뇌교육에 맞서다 곤욕을 치르신 건 한참 후에야 알았다. 국민교육헌장은 노무현 대통령때인 2003년 11월 폐기됐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데 익숙해졌다. 어떤 숭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전 근대적인 사고라는 공감대도 있다. 지식인 사회에서 전체주의나 파시즘은 경멸의 대상이다. 일반국민 사이에서도 일사불란, 멸사봉공, 총화단결은 아재를 넘어 꼰대의 행동특성으로 꼽힌다.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우여곡절과 희생이 있었다.
농반진반으로 우리사회엔 ‘3대 미스테리’란게 있다. 고대동문회, 해병전우회, 호남향우회가 그것이다. 이들의 불가사의한 단결력을 부러움반 조롱반으로 부르는 말이다. 고려대학과 해병대야 특정시기 특정분위기로 강한 유대감이 만들어지기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호남이라는 광대한 시공간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불가사의한 단결력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박통이래 반세기 지속된 ‘호남차별’의 결과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소외당하고 차별당한 호남인들이 서울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따로이 뭉쳐 애환을 달래고 서로 의지한 결과인 것이다. 결코 아름다운 미스테리는 못된다.
이제 ‘호남몰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자. 호남향우회의 무서운 단결력처럼 역대 선거에서 호남은 특정후보 특정정당에 표를 몰아주었다. 이는 경외의 대상이기도, 조롱의 대상이기도 했다. 개인의 참정권 행사인 투표에 있어서 아직 호남은 쇼핑하듯 매력적인 후보자를 고르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정권에서 소외되면 겪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일당독재와 다를 바 없는 호남의 정치지형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는 지적,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독약과도 같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호남몰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차별, 낙후,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호남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고 말하는 건 기실 슬픈일이다. 호남인이 투표에 있어서도 일사불란, 멸사봉공, 총화단결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어서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