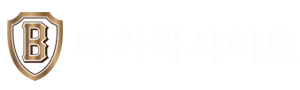교양학부
김상민 교수
‘K-컨텐츠’ 열풍이 뜨겁다. <기생충이 서구 주요영화제를 석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지구적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례 없는 주목은 몇몇 드라마가 단발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인기를 끌었던 과거의 ‘한류’와도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그야말로 글로벌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처음 공개된 28일간 무려 16억 5045만 시간 동안 시청되었는데, 이는 넷플릭스 영미권 드라마 중 1위를 차지한 <브리저튼의 6억 2,549만 시간을 압도하는 수치라고 한다. 이 통계를 보며 놀랐던 이유는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OTT플랫폼의 생태계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과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에는 옥스퍼드 사전(OED)에 접두사 K와 ‘K-드라마’(K-drama)가 함께 등재되었다. 이러한 등재는 K-드라마가 방탄 소년단을 위시한 K-pop과 더불어 영미권에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하나의 고유 명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실제로 여러 미디어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큰 위화감 없이 ‘달고나’를 만들고, 한데 모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다. <기생충이 서구의 주요 국제영화제를 휩쓸 때, 한국의 반지하와 ‘짜파구리’가 화제가 되고,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제시카 송’이 하나의 ‘밈’(meme)으로 인터넷 공간을 가득 채웠던 순간을 연상시킨다.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이 낯선 풍경이 의아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K-pop’이 그 음악적 특성을 구체화 해나가는 상황과 비교해볼 때, 영화나 드라마로 대표되는 ‘K-콘텐츠’는 아직 그 정체를 온전히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하게도 미디어가 주목하는 ‘달고나’와 ‘짜파구리’, 초록색 운동복이 이 열풍의 정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요소들에 주목하는 것은 과거 외부의 응시를 향한 우리의 케케묵은 반응을 연상시킨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을 구성해오지 않았던가. 출품할 만한 작품이 없어 “동남아 영화제에도 빈손을 들고 옵써버(observer)格”(이청기)으로 참가한 1955년 이후로, 한국영화는 외부에 우리를 어떻게 내보여야 할 것인지를 골몰해왔다.
이 전략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과장(self-Orientalism)하는 양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이러한 사고와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 한국의 특수한 시각적 표상과 그 세목들은 외국의 관람자들에게는 당연히 흥미로운 대상이겠지만, 우리마저 그것이 이 작품들의 본질이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 ‘사건’을 한국문화, 민족적 특수성에 한정시키는 순간, 우리는 다시 “Do you know Squid Game?” 같은 일차원적 질문에 갇히고 말 것이다.
IMDB(미국의 대표적 영화데이터 베이스)의 <오징어 게임 회차별 관객 평점에서 6화 <깐부는 9.3점으로 다른 회차보다 월등히 높다. 6화는 한 팀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와 동료를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게임을 다룬 이야기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게임의 법칙과 그 쾌락을 전시하는 대신 그들의 슬픔을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낯설게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한 관객들을 스크린 앞에 붙잡았던 것은 어쩌면 데스게임(death game)이라는 대중 장르가 가진 쾌락을 이용해 그들이 처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통치성을 성찰하도록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봉준호 감독은 과거 <기생충에 관한 <씨네21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장르영화가 사회성을 첨가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한국의 장르영화는 할리우드 장르와 다른 역사를 형성해왔다고 주장한다. 봉준호의 이러한 인식은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한 호소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대중영화의 장르마저 ‘사회적 예술’로 ‘재발명’한 한국적(K) 장르 개량인 셈이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정제된 이 K-당의정(糖衣錠)의 효능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Do you know squid game?”같은 외부를 향한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 이 탁월한 K-컨텐츠들이 보여주는 우리사회의 축도(縮圖)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