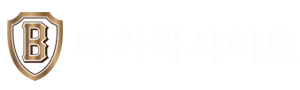교양학부
손동기 교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살까?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 기록 보유자는 프랑스인으로 쟌 칼망(Jeanne Calment) 여사이다. 그녀는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사망했다. 122세까지 살았다. 이 기록은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100세 시대를 많이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이 장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들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는 고령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그 비용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에서 ‘늙어 가는 것’은 어떤가?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했다고 답하는 비율은 32.6%에 불과하다. 한편 2020년 발표된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이고 노인 자살률은 53.3명(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1위다. 한국 사회에서 늙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재앙과도 같다.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라도 한국 사회에서 ‘늙어 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은퇴를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제3의 나이와 제4의 나이로 노후를 더욱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다. 제3의 나이는 은퇴를 한 연령층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제3의 나이에 있는 노인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행복한 연령층이자 가장 중요한 소비 계층으로 꼽힌다.
한편 제4의 나이는 초고령자들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어려움이 많은 이들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 빈곤율은 약 8%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프랑스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부모 세대와 같은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자식들이 부러워하는 부모들의 노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같이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은 크게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일자리를 두고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 노인들은 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보다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때문에 이들은 경제활동 이외에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할 틈도 없이 노인이 되어 버렸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노후의 긴 시간을 즐기기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국 노인들의 노후 여가문화는 ‘낮은 자기 결정권’ ‘비소비 형태’ 그리고 ‘집단적 참여’의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한국에서 늘어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좋은 예를 프랑스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프랑스의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은퇴를 잘 준비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노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대간 갈등이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노인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났을 뿐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할 때이다. 홀로 늙는 것보다는 더불어 살면서 늙어 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미래의 행복한 노후를 지금의 노인 세대에서 찾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