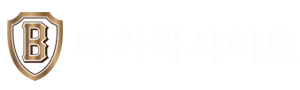신문방송학과
조경완 교수
11월이다. 보석같은 가을을 붙들고 있는 달이다. 아직은 청량한 하늘 아래 아름답게 물든 잎들이 머무는 계절이지만 이내 고엽(枯葉)과 나목(裸木)의 계절이 온다. 인생처럼.
서양의 한 시인은 11월을 한탄하길 “No로 시작하는 노벰버/ 잎들은 이미 모두 져버리고/쓸쓸함을 덮어줄 눈은 아직 오지 않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시인들도 11월엔 헐벗어가는 나무들에게 애처러운 시선을 던진다. “11월의 청빈한 나무들처럼/나도 작별인사를 잘하며/갈 길을 가야겠어요…”(이해인 11월의 나무처럼) “제몫을 다하고/아름답게 떠나는 낙엽처럼/시련이 와도 제 몫을 지키며 살게하소서…”(김덕성 11월의 기도) “나무들 한겹씩 마음을 비우고/초연히 겨울로 떠나는 모습/독약같은 사랑도 문을 닫는다…”(이외수 11월의 시)
잎을 떨구고 북풍에 외로이 울고 있는 나무를 보노라면 11월은 누구나 저 시인들처럼 삶에 있어 진실로 소중한 것들을 한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화려한 봄 꽃과 무성한 여름 잎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구르는 낙엽소리와 빈 가지의 실루엣이 주는 멜랑코리는 범부(凡夫)도 철인(哲人)이 되게하는 것이다.
지난주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노태우씨의 죽음이 그것이다.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정부도 어찌 고민하지 않았을까만 초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광주사람들의 마음은 착잡한 것이었다.
그는 군사정권의 2인자였다. 87년 대선이 직선이었다고 하여 그를 순수한 민선대통령으로 보는 이는 적다. 전두환씨를 도와 12·12 쿠데타를 한 정치군인이자 독재에 복무한 자다. 5·18과도 무관 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후 공로가 적지 않지만 박계동의 비자금 폭로 한방에 모리배로 전락한 그다. 옥고를 치르고 오욕의 만년을 보내다 2002년 전립선암 수술 후로는 대중앞에서 사라졌다.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광주사람들의 편치않은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의 아들이 광주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 그에 대한 절반의 용서는 이뤄졌다고 하겠지만 투병 중에, 아직 의식이 있을 때, 5·18의 진실에 대해 그가 고백해 줄 말은 없었을까. 죽음을 앞에 둔 겸손한 한 인간으로 한국 현대사의 한발짝 진전을 이룰 그의 참회는 불가능 했을까. 광주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장례를 외면하게 하는 이런 죽음밖에 그의 선택은 없었을까.
가을날 창가에 서서 지는 잎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삶의 가장 본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용서를 빈다는 추상적인 유언 같은거 말고 용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광주사람들도 그리고 국민 누구나도 그의 죽음에 추모의 꽃을 놓게 되지 않았을까.
참회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회를 구하는 노릇은 참 딱하고 어색하다. 참회(懺悔)는 불교용어다. 자전에는 뉘우칠 참, 뉘우칠 회라고만 되어있지만 ‘참’은 범어 크샴마의 음차다. 크샴마는 대중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의식이다. 죄지음을 널리 알려 부끄러워하고 죄닦음을 약속함으로써 해탈로 다가가는 방법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는 건 백번을 해보아야 가책에 불과하다. 사제를 커튼 너머에 두고 비밀유지의 믿음 속에 행하는 가톨릭의 고해성사도 참회일 수 없다.
참회록을 쓴 루소는 시작을 이렇게 썼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흉내 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 하나를 발가벗겨 세상 사람들에게 전시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루소는 약속대로 일찍 욕정에 눈뜬 소년시절, 유한마담들과의 불륜, 지적 허영과 오만에 가득 찼던 젊은날을 사실대로 썼다. 그가 지은 죄악을 낱낱이 고했는지는 모르되 대중 앞에서 크샴마를 한 것이다. 요컨대 참회는 용기의 소산이다.
11월의 첫날 아침에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며 참회없이 가버린 노씨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았다. 영화처럼 기승전결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역사는 속절없이 또 이렇게 흘러간다. 11월을 노래한 시 가운덴 많은 이가 아는 한편이 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