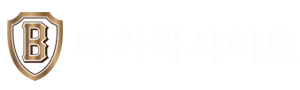신문방송학과
배미경 교수
더킹핀 대표
지난 15일 2038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준비위원회가 화려한 출범식과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에 닻을 올렸다.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를 결정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2030년 대회(카타르 도하)와 2034년 대회(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동시에 결정하면서 유치 가능한 가장 가까운 대회가 2038년 대회다. 따라서 이번 유치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17년 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된다.
2038년 대회까지는 2022년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네 차례의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에서 개최 도시의 리더십 교체와 정치적 상황은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 유치에 나선 인사들이 대회 개막식장에서 화려한 개막 팡파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당히 긴 시간이다.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가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의 충분한 교감 속에서 대회 유치가 준비될 수 있어야 하고, 17년의 시간 차를 고려한 튼튼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 후보 도시 선정 과정이 중요하다.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은 아시안게임으로 가는 1차 관문이다. 대한체육회 후보 도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승인,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에 따른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다. 대구와 광주가 힘을 합하였고, 이미 두 차례의 국제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양 도시인 만큼 대구시와 광주시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을 믿는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4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 시도지사가 공동 유치를 결의했지만, 유치의향서도 내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대회 유치 계획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국제행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대회 유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과오로 보인다.
46개 종목에 17개 신축 경기장을 짓고 사후 활용 문제로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선례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권고한 문학경기장을 대신하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신축한 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순수 경기시설이 아닌 웨딩시설로 임대까지 줬지만, 임대료마저 내지 못해 적자에 허덕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중요한 것은 대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40개 이상의 종합 경기대회가 치러지는 만큼 경기장 확보와 활용 계획이 중요하다. 스포츠대회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항목이 경기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이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보유한 경기장의 상당 부분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용으로 신축하거나 개축되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대회였다. 따라서 2038년이면 대구 경기장은 35년, 광주경기장은 23년 차에 접어든다. 현재 있는 경기시설의 마모율을 고려한 경기장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개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한 도시의 개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의사결정의 지연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공동 개최 도시 간의 합의 문제 등이다. 개·폐막식 개최지 결정, 경기 종목 개최지 분배의 문제, 선수촌 분산에 따른 운영 비용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하다. 대회 유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들 다양한 변수들을 잘 반영한 기본 플랜이 짜여져야 유치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이 내용이 유치 신청서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