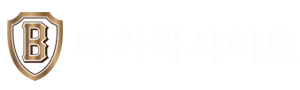컴퓨터공학과
백란 교수
AI빅데이터연구소장
2016년 3월의 세계적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였습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죠. 최고의 바둑기사와 최고의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의 대결로 주목받았으며, 5일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다섯 번의 대국이 열린 결과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이세돌의 은퇴 대국으로 치러진 토종 AI, 한돌과의 대결 역시 국내 AI 프로그램의 기술 향상과 발전 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현재, AI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깊숙이 자리매김할 겁니다. AI와 공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AI 시대에 AI와 사람의 관계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알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룹’과 ‘인공지능과의 친밀도가 떨어진 그룹’으로 구분한다면, 미래의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가 전자에 속하기를 원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AI를 바로 알고 그 기술을 발전적으로 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지털에서 얻은 정보를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로 접한 정보를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라고 부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가트너 그룹은 2017년 미래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이 되면 대부분이 진짜 정보보다 가짜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AI를 바로 알고 그 기술을 발전적으로 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지털에서 얻은 정보를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로 접한 정보를 정확히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 콘텐츠,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디지털에 기반해 바른 소통을 하는 소양을 말합니다. 기술과 도구를 잘 다룰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윤리, 예절 등의 소양까지 포함합니다.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갖출 수 있을까요? 신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배우고 익혀야 할까요? 기술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back to the basic) 합니다. 본질은 인간과 기계의 소통입니다. 지난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연재 칼럼에서도 ‘정보교육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 즉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해 기계(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교육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는 소프트웨어(SW) 지식, 도메인 지식(전공 분야의 지식), 논리적 수학적 지식입니다. 그중 정보교육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AI 시대에 기계와 소통하는 언어인 코딩 교육, 나아가 정보교육의 체계를 적극 투입할 때입니다.
또 AI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모두각자의 전공 영역(도메인 지식)을 학습해 데이터를 수집, 구축하고 도메인 지식에 기반해 효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계(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잘 다루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SW 지식 함양, 즉 기본 코딩교육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교육부터 시작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민 교육을 통해, 신기술과 성공적으로 공존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여성신문은 한국여성정보인협회와 공동 캠페인으로 총 4회에 걸쳐 SW교육의 발전적 전략을 공유하는 칼럼을 게재한다.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국내외 교육과정 혁신 사례, 정부·연구소·현장에서 본 SW교육의 방향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