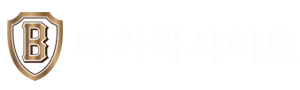교양학부
이강선 교수
작년 봄, 광주로 옮겨왔을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끈 지명이 ‘극락강’이었다. 학교로 가는 도로에 있는 표지판에서 읽은 ‘극락강역’이라는 지명이 신기했던 것이다. ‘극락’이라니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는 것일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다. 요단강을 건너듯 저 극락강을 건너면 극락으로 가는 것일까. 주변에 ‘극락사’ 혹은 ‘극락암’이라는 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딘가에 한국인의 특징을 짙게 담은 설화가 있는 것일테지. 광주 토박이 지인에게 물었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어느 휴일, 극락강을 찾아 나섰다. 우선 역에 들렀다. 기차가 하루에 두 번 선다는 간이역사에 직원이 두 명, 초등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듯 역무원 제복이 여러 벌 걸려 있었고 흰 벽에는 토종 닭과 토종 꽃 그림들이 있었다. 벽에 걸린 안내문을 샅샅이 읽었지만 찾는 내용은 없었다. 역무원에게 물었다.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광주 토박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에게 물었다. 상상을 너무 오랫동안 키웠던 탓일까. 그가 찾아준 극락강의 유래는 지형에 관한 것으로 마음에 차지 않았다. 광주 치평동과 쌍촌동 사이의 영산강 구간이라는 설명은 단순한 지리적 설명에 불과하다. 이토록 멋진 이름에 유래가 없다니. 이름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내가 살고있는 고장의 유래를 안다면 그곳이 몇 배로 정겨워진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다. 이 곳에 내가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의 정체성이 굳건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걷기의 인문학’으로 유명한 리베카 솔닛은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에서 이름의 중요성을 논한다. 정확한 이름은 곧 그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불분명한 정체성은 혼란을 키운다.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슬로건은 그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흑인의 목숨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대번 알 수 있다.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에는 그 책의 내용이 들어 있고 주제가 들어 있으며 책의 성격도 목적도 들어 있다. 이름이 포함하는 규모가 작을수록, 엄밀할수록 그 내용을 잘 드러낸다. 내가 발을 딛고 선 이곳은 지상의 한 점이다. 지상에서 점 하나가 사라지면 세계 전체에 구멍이 난다. 분명한 이름은 그 점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결국 무수한 검색을 통해 극락강의 유래를 알게 되었다. 광주시립박물관의 민속학예사는 이 이름이 불교에서 유래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극락’이라는 이름은 ‘극락원’이라는 여관에서 비롯했단다. 여관, 여행자들이 지친 몸을 쉬고 끼니를 때우는 곳. 강나루이니 순례자들이 쉬어가는 곳. 조선시대까지 극락원이 존재했다니 역사는 더욱 오래 되었을 것이다. 결국 극락강이라는 이름에는 종교와 역사와 지형이 들어 있었다.
종교는 선악을 말하는 판단의 기준이다. 어느 땅의 역사는 내가 여기 서 있는 근거다. 지형은 그 역사에 속하게 된 배경이다. 종교가 보편성이라면 역사는 국가적 특수성, 지형은 지역적 특수성이다. 내가 여기 선 이유는 개인적인 특수성이다. 극락강에 담긴 모든 유래는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의 일부인 것이다.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었다. 일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당연한 것들을 찾아다니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기까지는 반드시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는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 의미는 나의 일부다. 지금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안다면 뿌리는 더욱 강해지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