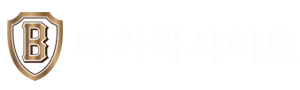사회복지학과
김선녀 교수
아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한 시민이자 국가의 미래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받을 권리의 주체이다.
특히 저출산·초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8년 0.98명의 벽을 넘어버렸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2020년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출생할' 아이에 대한 관심은 집중시킨데 반해 정작 '출생한' 아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로도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아동권리 보장원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에서 '2019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이 57.7%(1만7천324건)을 차지했으며, 입양가족은 0.3%(84건)에 불과했다. 그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이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이며, 친모가 상당수임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의문을 품는다. 과연 모성애는 존재하는가?
이쯤에서 우리는 여성에게 씌워진 모성애의 실체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녀 돌봄과정에 있어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와는 다르게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본다는 '모성애 프레임' 속에서 여성의 희생은 당연하게 학습되고 소비되어 왔다.
프랑스의 철학자 엘리자베트 바댕테르는 <만들어진 모성에서 '모성애란 본래부터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모성애란 하나의 감정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우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은 여성이 어머니이기 이전에 본성적 이기심을 가진 한 인간이기에 숭고한 사랑만으로 자식을 돌보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회학자 오나 도나스는 <엄마됨을 후회함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엄마가 된 것이 축복만은 아니라고 말하며 '모든 여성이 엄마가 될 필요는 없다'는 부제로 여성들의 드러나지 않은 목소리를 담았다. 나아가 엄마가 되어 아이들만 보살피라는 사회의 요구는 비도덕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데 결국 강요된 모성애 뒤에 은폐된 아동학대 증가 현상은 여성의 변화된 모성애 가치관을 묵과하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헌신적이며, 육아와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모습이 이상적인 어머니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현대 여성은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자아성취의 욕구가 강한 독립된 여성으로서 과거의 '이상적인 어머니상'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기적인 어머니상'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자녀양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기대와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제 여성에게 있어 자식을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며,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를 능가한다는 거룩한 사회 통념은 여성을 아동 양육의 전담자로 등극시키는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엄마' 이미지에 맞는 부단한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아동학대 증가 현상은 아이를 더 이상 강요된 모성애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어머니와 아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선 여성에게 강요된 허울 좋은 모성애에 관한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라야 아이에 대한 무한한 공감과 책임감이 동반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성모마리아로 미화된 '희생적인 모성애'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여성 자신의 행복도 추구할 수 있는 '이기적인 모성애'를 허용할 때 '강요된 모성애'가 아닌 '진정한 모성애'로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왜곡된 모성애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건강한 애착 형성이나 부모의 돌봄 결핍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원가족 성장 과정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