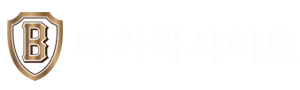교양학부
신선혜 교수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어디서 배우는가. ‘학교’ 그리고 ‘교과서’라는 뻔한 답이 예상되지만, 현실은 결코 뻔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설, 드라마, 영화로 역사를 배운다고 답한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을 보면 역사 콘텐츠를 역사 교육의 보조 교재쯤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사실 역사학은 일찍부터 사료를 생산하고, 그것을 모으며, 분류 및 평가하고, 마지막에는 후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해 왔던 것이 역사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학은 현대 디지털 인문학이나 문화 콘텐츠 분야의 핵심 원천으로, TV·영화·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를 활용한 ‘역사 콘텐츠’가 다수 생산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 콘텐츠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추동하여 역사의 대중화를 견인하였다. 특히 영상 등의 새로운 플랫폼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역사 콘텐츠는 텍스트에 갇힌 교과서 속 역사를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적화된 시청각 자료가 되고 있다. 다만 역사 콘텐츠의 장점을 역사의 현장을 재현해준다는 시각에서만 파악한다면 여전히 ‘주’가 아닌 ‘부’적인 활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 콘텐츠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제시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부각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황산벌’을 살펴보자. 660년 백제와 나·당연합군 간의 황산벌 전투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황산벌 전투를 기존에 민족통일전쟁 일변도로 해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민중 및 패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기야”라고 말하는 부분은 삼국 간의 전쟁이 민족통일이 아닌, 지배층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것으로, 백제 및 신라인의 동족의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충분히 추론 가능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일반 병사가 “백제가 이기든 신라가 이기든 상관없다. 단지 공을 빨리 세워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다”라고 함으로써 전쟁과 통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잊혀진 민중의 삶 역시 역사로서 부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역사 콘텐츠는 역사의 비어 있는 부분을 촘촘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 콘텐츠를 ‘주’로 역사를 교육하는 것에는 팩트와 픽션의 구분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역사 콘텐츠 속 ‘팩션’에서 남발되는 오류나 왜곡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시청률이나 흥행이라는 한계 속에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교과서에 갇힌 역사를 지루해하는 학생들은 팩션이 팩트이기를 바라며 혹은 믿으며 역사 콘텐츠를 ‘즐기는’ 것에서 멈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나 왜곡이 역설적이게도 역사 콘텐츠가 중등교육, 나아가 라이브바카라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배가시킨다. 역사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며 가공하는 것은 작가나 ‘역사 전달자’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고증을 통한 역사의 실체를 바탕으로 추상적 상상력을 역사적 상상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역사 연구자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 콘텐츠와 관련하여 라이브바카라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중등교육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면 역사에 대한 지속적 흥미는 물론 단계적 이해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 콘텐츠 교육은 라이브바카라의 안과 밖-중·고등학생 및 일반 대중-을 이어주는 역사 교육의 방법이라 하겠다.
최근 대하사극의 제작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KBS의 ‘태종 이방원’ 제작을 시작으로, 김진명의 소설 ‘고구려’가 드라마화되고, ‘조선 왕비 열전’(가제)의 제작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모두가 정통 사극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부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철인왕후’ ‘조선구마사’와 같이 무분별하게 역사를 왜곡한 역사 콘텐츠에 대한 충격이 제작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수준 높은 역사 콘텐츠는 역사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