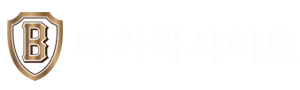외식조리학과
이선호 교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봄이면 저를 데리고 논두렁 밭두렁으로 나가서 쑥을 채취한 다음 가마솥에 쑥개떡을 만들어 이웃들과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곤 하셨다. 올해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햇살을 기다리며 어머니 산소에 갈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추억에 잠기게 된다. 차가운 꽃샘바람을 맞으며 곧 쑥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하다.
쑥은 단군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건강식품으로써 오래 전부터 주목 받아 왔다. 쑥의 한약 이름은 ‘애엽’으로 예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옛말에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는 표현이 있듯이 쑥은 마늘, 당근과 더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꼽힐 만큼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방사능과 황사 등으로 신체의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바로 쑥이 피를 정화시키고 부족한 피를 보충해 주며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탁월하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쑥을 오래 먹으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에서 쑥을 구입할 때는 줄기가 뻗어나가지 않고 응달에서 나온 어린 쑥이 좋다. 이른 봄철 응달에서 자란 어리고 부드러운 잎이 향과 맛이 뛰어나다. 이른 봄에 어린 쑥을 따서 삶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쑥을 보관할 때는 수분이 약간 남아 있게 말려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손질할 때는 어린 쑥을 칼로 밑동을 잘라내고 소금물에 헹궈 이용한다.
한자로 봉(蓬)은 쑥이다. 쑥은 봄에 돋아나, 이름 그대로 ‘쑥쑥’ 자란다. 갓 나온 쑥의 새싹은 향기롭고 피를 잘 돌게 하여 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쑥 아(莪)자는 열십자(?)가 두 개로 100세를 뜻하니 쑥을 먹으면 100세 산다는 의미로 풀기도 한다. 애엽(艾葉)은 쑥애자와 잎엽자로 쑥잎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쑥을 식재료 삼아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다.
옛 조리법을 담은 1680년경의 요록(要錄)에는 ‘쑥절편’을 만드는 요령이 담겨 있다. 우선 쑥잎을 잘게 짓찧어 맑은 잿물에 삶아서 건져 놓았다가 여러 번 씻는다. 쌀가루에 그 쑥을 넣고 섞어서 시루에 쪄낸 다음 다시 잘 찧어서 안반 위에 놓고 기름을 발라 밀어서 임의대로 틀에 찍어 내면 된다.
또한 1800년대 말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쑥애탕’ 조리법이 소개돼 있다. 쑥에서 싹이 돋는 것을 뜯어다가 깨끗이 다듬고 씻어 한 줌 정도를 다진다. 쇠고기도 한 줌 정도를 다져서 쑥 다진 것과 합하고 기름장과 양념을 갖춰 넣고 주무른 후 밤만 하게 환을 만든다. 탕을 끓일 때 장국이 팔팔 끓으면 환에 달걀옷을 입힌 다음 넣는다. 북어 껍질도 가시가 없게 하여 깨끗이 빨아서 같이 넣고 끓이되 두 그릇 정도가 되도록 끓인다. 때로 둥글게 환을 만들지 않고 다진 쑥과 고기 양념한 것을 장국이 끓을 때 수저로 덩이덩이 떠넣기도 한다.
‘쑥인절미’는 1934년 발간된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 나와 있다.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물에 하룻밤 동안 불려서 시루에 넣고 소금물을 뿌려서 잘 찐다. 그리고 안반에 보자기를 펴고 쏟아서 대강 찧어서 헤어지지 않을 만큼 되거든 보자기를 벗겨 내고 쳐서 쌀알이 보이지 않도록 될 때에 연한 쑥을 깨끗하게 씻어서 삶아 절구에 곱게 찧는다. 이것을 떡에 함께 섞어서 다시 서로 잘 섞이기 까지 찧어서 적당히 빚어서 팥이나 콩가루를 묻힌다.
‘쑥개떡’ 만드는 법은 1936년 간행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소개돼 있다.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을 갈아 다시 체에 친 다음 물에 반죽하여 둥글넓적하게 만든다. 여기에 쑥도 함께 넣고 반죽해 밥 지을 때 함께 쪄서 기름을 발라 먹는다.
음식 전공자의 음양오행(陰陽五行) 관점에서 보면 녹색은 간 기능과 신진대사에 효능이 있어 쑥을 이용한 음식은 봄철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는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뜻으로 제 땅에서 산출된 것이라야 체질(體質)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다가오는 봄바람에 추억의 고식재료(古食材料)인 쑥 관련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