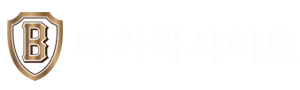영어영문학과
김강 교수
시중에 나도는 흔한 불평 중 하나는 정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작 그들을 뽑아줬던 유권자 수준과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구 350만의 우루과이는 아니었던 듯하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농장에서 지내며 급여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던,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영국 BBC 뉴스는 그의 거주지를 다음처럼 소개한다. 숙소 밖에는 빨래들이 널려 있다. 마실 물은 잡초가 무성한 앞마당의 우물에서 몸소 길어 온다. 외곽경비는 겨우 두 명의 경찰관과 다리가 세 개 뿐인 '마누엘라'라는 이름의 개가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바로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관저다.
그의 생활방식은 지구촌 대부분 다른 정치적 지도자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는 정부가 제공했던 호화로운 대통령 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 비포장 도로변에 위치한 부인의 농장주택에 그대로 살기로 했다.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며, 부인과 함께 농장의 땅을 직접 일구어 화초를 재배한다. 그는 대통령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이웃이며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오롯이 실천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소박한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대통령 한 달 봉급의 90%를 기부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검소와 청빈의 타이틀과 함께 국민의 '페페(할아버지)'라는 친근한 별명을 붙여줬다.
유럽 이민자의 가난한 후손으로 태어난 그의 본명은 호세 알베르토 무히카 코르다노. 1935년 5월 20일 출생했으니 86세다. 우루과이 정치인으로 2010년 대통령에 취임해 2015년 후임자에게 정권을 이양한 뒤 퇴임했다. 그해 다시 상원의원으로 활동 했으며 지난 10월20일 정계은퇴를 선언한다.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하는데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기나긴 여정의 고단함'이라는 개인적 사유도 덧붙였다. 퇴임 후 고즈넉한 사저 준비는커녕 2018년 상원의원에 주어지는 연금마저 거절한 바 있다.
호세 무히카는 젊은시절 쿠바혁명의 영향을 받아 1960년대에 빈곤한 우루과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려는 도시 게릴라 운동의 전사로 활동했다. 70년대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6차례나 총상을 입었으며 고문과 독방 등 14년간 수감생활을 겪었다. 이후 민중참여운동에 투신 했으며 게릴라 출신으로 첫 하원과 상원을 거쳐 2005년 좌파정부에서 농목축수산부장관을 역임했다. 대통령 재임 중 진보적 행정가로 사회·경제적 혁신을 거뒀다는 평가다. 실업률과 빈곤율을 낮췄으며 퇴임 무렵 지지율은 64%에 이르렀다. 우리가 감히 엄두도 못 낼 궁극의 믿음이다.
그는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뿐 아니라 명연설가로도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 "우리는 더 많이 일 합니다. 돈 나갈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할부금을 다 갚을 때쯤이면, 인생이 이미 끝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일하고 알약으로 불면증을 해소하고 전자기기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생각이 지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태주의적 세계관이 담긴 유엔회의 연설이다.
먹방, 집방, 트롯방에 연일 시달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충고도 찾아본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치스런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에서 성공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격려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리더십이란 리더 자신의 도덕성과 정의, 책임감 없이는 그 시작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득, 우리의 라이벌로만 여겼던 남미의 축구강국 우루과이가 고집스런 정치적 선동과 권력 망상보다는 '조금 더 떳떳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위해 평생을 겸손하게 헌신한 호세 무히카를 대통령으로 먼저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