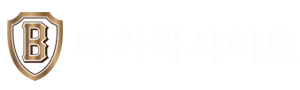교양학부
이준석 교수
게임은 다른 사업과 달리 불황 속에 도리어 기회를 잡는 사업군 중 하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도 게임시장은 역시 전례 없는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시대에서 보여 준 게임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서가 아닌,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콘텐츠로서의 모습이었다.
가장 달라진 것은 새로운 소통의 플랫폼으로서의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들은 보통은 사용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적인 생일 파티나 축하 파티를 게임 속에서 즐기거나 결혼식, 장례식을 게임 속에서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식적인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게임 속에서 진행되고 회사의 사내 회의나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게임은 놀이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즐겁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게임이 축하와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얼마 전 게임을 하나의 질병으로 지정한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방법으로 게임 플레이를 권장하고 있고, ‘플레이어파트투게더’(#PlayApartTogether)의 “떨어져서 같이 놀자” 캠페인처럼 전 세계적 비대면 소통 운동의 중심에는 게임이 있다.
기업들 역시 게임을 비대면 소통 혹은 마케팅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크 제이콥스, 발렌티노, 안나수이, GCDS, 나이키 등 업계들이 게임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온라인 게임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의상들을 입은 아바타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게임의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사례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를 타깃으로 한 콜라·라면·과자류의 마케팅이었다면, 근래는 샴푸·은행·안경 등 전 방위적으로 마케팅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의 카트라이더 콜라보, 이마트와의 콜라보 등을 진행한 넥슨의 경우 얼마 전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게임’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게임시장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정식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 e-스포츠는 타 스포츠와는 달리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 대부분의 경기를 진행했고 올해 ‘롤드컵’(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은 코로나 속에서도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0 롤드컵‘ 누적 시청 시간이 10억 시간을 넘어섰고 ‘플레이-인 스테이지’는 분당 평균 시청자는 작년보다 87.2% 늘어난 360만 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누적 시청 시간이 작년보다 61.8% 늘어난 1억 6092만 시간이었고 결승전 분당 평균 시청자 수는 2304만 명,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4595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로 e-스포츠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제39차 총회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게임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산업으로 지목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안에는 게임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 게임 기업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19조 9000억 원, 수출액을 1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10만 2000개로 늘릴 것을 목표로 잡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통해 게임을 코로나 시대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게임업계 전반을 봤을 때 고무적인 일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듯 게임은 이제 놀이의 수준이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간이 느끼는 고립감이나 폐쇄감은 수동적인 동영상 시청보다 게임을 플레이하며 채팅을 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게임의 진정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게임의 사회 문화적 확장과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는 공감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