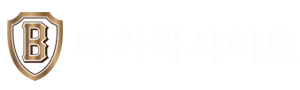영어영문학과
김강 교수
지난해 이맘때였다. '문학과 영화'라는 수업 중이었다. 전자출석 체크를 위해 '스마트'폰을 만지던 차에 미래의 교육에 대한 '김칫국' 단상을 학생들에게 맛보였다.
"아마도 아주 가까운 날에 강의실이 없어질 거야. 칠판도, 책상도, 창문 밖 호기심에 기웃대는 버들가지도 함께. 말 그대로 학교가 사라지는 거지. 그때는 언제든 원하는 데서 마음에 든 수업을 '앱'으로 듣겠지. 시공간적 제약이 제거된 일종의 '앱택트 스쿨'이랄까. 이 스마트 폰 하나면 만사오케이지. 클래스매니저 '일'명만 있으면 수십만 학생들 수업이 가능할거야. 그러면 교수도 없어질게고. 에구, '에이 아이'가 다하겠지. 서운하지만, 셰익스피어 말처럼 '왓 어 브레이브 뉴 월드'네."
딱 일 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위협 속에 비대면 '언택트'수업이 대세가 됐다. 2020년, 4차 산업혁명의 초입기에 아무도 예측 못했던 인공지능 'AI거인'의 기습적인 진격이다. T. S. 엘리엇이 진단한 '잔인한 4월'이 또다시 도래한 것일까.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제시한 '양질전환의 법칙'은 변증법 철학에 기초한 개념이다. 일정한 양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양적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질적변화는 급격한 폭발로 나타난다. 이 생각은 후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계급혁명의 연계성을 정립한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근간이 되었다.
자연법칙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이 대표적인 경우다. 물은 상온에서 99도까지 액체성질을 보존하지만 100도라는 임계점에 다다르면 수증기가 되어 질적으로 변화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끓는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에너지가 축적되면 어느 순간 폭발하고 이전과는 다른 환경을 만든다. 이를 경제사회용어로 '산업혁명'이라 불렀다.
18세기 1차 산업혁명이 수공업에서 벗어나 증기기관(1784년)을 동력으로 한 기계화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뤄진 전기에너지(1870년경)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이다. 이를 토대로 통신기술이 발달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등장한 시점이다. 특히 20세기 후반(1990년대) 정보통신과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가속화됐다. '노동의 종말'을 펴낸 미국의 문명비평가 제레미 리프킨은 이 시기의 특징을 인터넷 기술과 재생 에너지로 꼽았다. 인류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은 AI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융합의 시기다. 21세기 초(2010년 이후)에 들어서 실제와 가상의 통합으로 사물들을 자동으로 혹은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물리 시스템이 구축된 시기를 일컫는다. 제2차 정보혁명이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CEO 클라우스 슈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는 '융합'과 '속도'이다.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기술들이 새로운 형태로 융합되어 확산되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2016 다보스 포럼은 이미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중이라고 선언했다. 지금 세상은 ICT를 바탕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 주도하는 대변혁의 시대다.
AI는 4차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로봇과 생명공학, 나노기술,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산업과 서비스에 결합된다. 실세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계산, 인식, 판단 등 전통적인 인간지능의 영역이 시나브로 통합, 속도, 능률을 지향하는 '기계적 능력'으로 대체되는 트렌드다.
이러한 기술폭발과 사회변혁의 시대에서 기계가 주체인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일까, 혹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무쌍히 궁금하다.
이번 학기에 새로이 개설한 '영화 속 AI와 미래사회'라는 과목도 인간과 기계의 가능한 공존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하자는 야심에서 비롯됐다. 여러 형태와 기능의 AI가 인간에게 선이냐 악이냐, 미래의 주인공은 휴먼인가 AI인가, 기계와 인간의 경계는 어디인가 등의 난제에 현실적 답을 달아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추론하자면, 미래의 테크기술은 인간 본연의 '휴매너티'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 제러미 벤덤과 미셀 푸코가 설계한 파놉티콘(원형감옥)의 '감시의 시선'은 이제 들뢰즈에 의해 '정보통제 기술'로 무섭게 자라났다. 정보독점과 기술상업화로 인한 기업자본의 거대화는 자칫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될 것이다.
장밋빛 희망은 금물이다. 흑사병이 중세의 삶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했듯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의 세계도 전례 없는 사회적 혁명을 겪을 것이다. 정치구조, 노동시장, 인간관계 등 현재의 삶과 생각에 빅뱅의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그래도 인류의 미래는 '사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