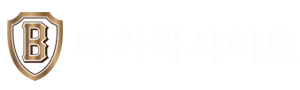영어영문학과
김강 교수
아이스킬로스는 고대 비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극작가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그리스 3대 비극작가로 손꼽힌다. 그의 비극은 인간의 오만이 죄를 잉태하고 그로인해 필연적으로 벌을 받는다는 윤리적 메시지를 강조한다.
기원전 458년에 쓰인 그의 대표작인 '아가멤논'은 그리스 비극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3부작 '오레스테이아'의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의 신화적 배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릇된 관계와 교류에 대한 것으로 지금 당장 곱씹어보아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작품의 배경인 아트레우스 가문의 시조는 탄탈로스다. 그는 신들의 아버지이자 제왕인 제우스의 아들이다. 다른 신들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올림포스 신들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었지만, 그의 속내는 신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도전적이다. 그가 저지른 가장 불경한 행위는 신의 예지능력을 떠보기 위해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죽여서 만든 음식을 신들에게 제공한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신들은 음식을 보는 순간 이를 알아차렸지만 데메테르 여신은 딸 페르세포네가 지옥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된 상황에 정신이 없어 펠롭스의 어깨부분을 먹고 말았다. 신들은 이에 분노했고 탄탈로스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으니, 이 형벌이 바로 영원한 갈증과 기아에 고통 받는 '탄탈로스의 가책'이다. 게다가 신들은 죽었던 펠롭스를 되살려 가문대대로 저주를 퍼부었다.
탄탈로스의 자손들이 겪는 참상은 끔직하다. 펠롭스는 결혼을 위해 장인이 될 사람을 죽인다. 아트레우스와 트에스테스라는 두 아들 중에서 동생 트에스테스는 형수와 간통했고, 이를 알게 된 형은 동생의 아들 즉 조카들을 죽여서 요리한 다음 동생에게 먹였다. 남아있는 손과 발을 따로 건네주며 모욕했음은 물론이다. 트에스테스는 복수를 위해 신탁을 따라 자신의 친딸과 결혼해 아들 아이기스토스를 낳고, 후일 자신을 길러준 아트레우스가 친부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차 없이 그를 죽였다.
다음세대인 아가멤논 때에는 인간들의 관계가 더욱 엉망이다. 아트레우스는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라는 두 아들을 두었고, 이들은 각각 클리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라는 자매와 결혼한다. 이 헬레네가 바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그리스 최고의 미인으로, 16세기 영국의 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18세기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19세기에는 독일의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그리도 찬양했던 여자다.
재앙은 아가멤논이 출정 전 사냥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슴을 실수로 죽이게 되고 이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양으로 바친 데서 생겨난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딸을 살해한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을 죽이기 위해 '레드 카페트'를 밟고 집에 들어오도록 설득한다. 이는 신들만의 영예로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면 오만의 죄를 범하는 셈이다. 그녀는 목욕탕에 있는 아가멤논을 양날도끼로 세 번 내리쳐 살해한다. 이것은 동물번제를 바치는 방식으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사랑하는 딸이 피를 흘린 방식 그대로 남편에게 복수한 것이다.
이 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가족 간에,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 원흉의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자식을 희생 삼아 치른 거사는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참담한 결과를 낳는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가족의 불화가 되고,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근원이 된다.
간혹 자식의 언행이 나를 닮았다는 새삼스런 각성과 대면할 때 우리는 소스라친다. 자식의 얼굴은 곧 나의 모습이다. 자식의 허세와 오판은 사실 부모의 그것이다. 자식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신이 내린 일종의 '윤리적 제어장치'인 셈이다.
한반도가 절반에서 또다시 동강난듯하다. '치킨게임'마냥 '진보 반 보수반' 대결이 치열하다. 개혁대상이라는 검찰은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제처럼 정체가 모호하고, 언론은 재빨리 조국대전을 이념의 최전방에 쑤셔 넣고 저울질이다. 무위도식 얌체들이 기생하는 국회는 불러도 불러도 대답이 없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는 어느새 판세를 키운 선거풍에 떠밀려 메아리처럼 아련하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념의 덫에 사로잡혀 '조국'의 앞날을 망칠 것인가. 자식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우리의 어떤 수치가, 아니면 어떤 긍지가 장차 그 속에서 피어날 것인지 헤아려보자. 부디 자식과 후손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정직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자.